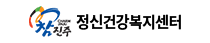주요기사
[조선일보] drunken in public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2-01 11:46 조회18,803회 댓글0건본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7년 전 미국 워싱턴 D.C.에서 특파원 생활을 할 때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진 적이 있다. 몇몇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다가 반주로 시작한 술이 다소 과했다. 나도 상당히 취한 터라 도저히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일행 중 술을 잘 못마시는 친구가 있어 내 차를 놔두고 그 친구의 차를 얻어타고 귀가하기로 했다.
차가 불과 몇 블록을 갔을 때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차를 세울 것을 명령한 뒤 운전하는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다.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과연 처벌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상황이어서 ‘일직선으로 걸어보아라’ ‘두 팔을 들고 한 다리로 서보아라’ 등을 시키며 시간이 길어졌다. 그때 나는 친구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차문을 열고 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경찰관에게 “그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경찰관들이 달려와 나를 뒤로 돌린 채 바로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경찰차에 태워 유치장으로 직행했다. 죄목은 ‘drunken in public’, 즉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하룻밤 유치장에서 자고 다음날 술이 깨면 내보내주겠다”는 경찰관의 말이 곧 법이었고 꼼짝없이 유치장 신세를 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경범죄에 해당했다. 마개가 따진 술병을 들고다니거나 차에 두는 것도 안된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는 부랑자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종이봉투에 술병을 숨겨가지고 홀짝거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자기 집이나 음주가 허락된 식당이 아니면 사실상 술을 마실 수 없다.
새삼 부끄러운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며칠 전 서울역사에서 벌어졌던 노숙자들의 난동사건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었다. 난동사건이 있기 전에도 평소 노숙자들이 집단적으로 진을 치고 있어 일반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마구 오물을 쏟아놓고, 불을 피우고 하는 일이 있어왔다. 몇 명 안되는 노숙자로 인해 공공시설의 기능이 방해받는 일에 대해 우리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4개의 경범행위 가운데 얼핏 보아도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등 얼마든지 처벌할 근거가 있다.
알다시피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홈리스(homeless)’들로 넘쳐난다. 길거리, 지하도, 공원의 구석진 곳, 방치된 건물 등에는 어김없이 홈리스들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이 안보는 곳에서는 몰라도 드러내놓고 술을 마실 수도, 취해 있을 수도 없다. 지나가는 행인을 해코지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정해진 선(線) 밖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즉각 경찰이 연행해간다. 이런 일 가지고 몇 개월씩, 몇 년씩 가둬둘 수 없다. 그러나 홈리스들도 경찰에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라도 가급적 법규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은 보기엔 안좋아도 일반인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는 않는다.
물론 노숙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하고 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의 코 앞에서 멈춘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제발 우리 경찰관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차가 불과 몇 블록을 갔을 때 경찰차가 따라붙었다. 그리고 차를 세울 것을 명령한 뒤 운전하는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어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했다. 술을 먹기는 먹었는데 과연 처벌을 해야할지 말아야할지 애매한 상황이어서 ‘일직선으로 걸어보아라’ ‘두 팔을 들고 한 다리로 서보아라’ 등을 시키며 시간이 길어졌다. 그때 나는 친구를 도와주려는 생각에 차문을 열고 나가 혀 꼬부라진 소리로 경찰관에게 “그 친구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 순간 경찰관들이 달려와 나를 뒤로 돌린 채 바로 수갑을 채웠다. 그리고는 경찰차에 태워 유치장으로 직행했다. 죄목은 ‘drunken in public’, 즉 공공장소에서 술에 취해 있었다는 것이다. “하룻밤 유치장에서 자고 다음날 술이 깨면 내보내주겠다”는 경찰관의 말이 곧 법이었고 꼼짝없이 유치장 신세를 졌다.
나중에 알고보니 미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술을 먹는 행위가 우리나라의 경범죄에 해당했다. 마개가 따진 술병을 들고다니거나 차에 두는 것도 안된다. 그래서 미국 영화에서는 부랑자 같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종이봉투에 술병을 숨겨가지고 홀짝거리는 장면을 종종 볼 수 있다. 자기 집이나 음주가 허락된 식당이 아니면 사실상 술을 마실 수 없다.
새삼 부끄러운 옛날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며칠 전 서울역사에서 벌어졌던 노숙자들의 난동사건 때문이다.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법이 집행되고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었다. 난동사건이 있기 전에도 평소 노숙자들이 집단적으로 진을 치고 있어 일반 시민의 공공시설 이용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마구 오물을 쏟아놓고, 불을 피우고 하는 일이 있어왔다. 몇 명 안되는 노숙자로 인해 공공시설의 기능이 방해받는 일에 대해 우리 경찰은 수수방관했다고밖에는 말할 수 없다.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54개의 경범행위 가운데 얼핏 보아도 불안감 조성, 음주 소란, 인근 소란, 위험한 불씨사용 등 얼마든지 처벌할 근거가 있다.
알다시피 미국의 주요 대도시는 ‘홈리스(homeless)’들로 넘쳐난다. 길거리, 지하도, 공원의 구석진 곳, 방치된 건물 등에는 어김없이 홈리스들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는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남이 안보는 곳에서는 몰라도 드러내놓고 술을 마실 수도, 취해 있을 수도 없다. 지나가는 행인을 해코지하는 일은 더더욱 할 수 없다. 정해진 선(線) 밖으로 한 발만 내디디면 즉각 경찰이 연행해간다. 이런 일 가지고 몇 개월씩, 몇 년씩 가둬둘 수 없다. 그러나 홈리스들도 경찰에 끌려다니는 게 싫어서라도 가급적 법규정을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은 보기엔 안좋아도 일반인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지는 않는다.
물론 노숙자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하고 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내 주먹을 휘두를 자유는 상대방의 코 앞에서 멈춘다’는 법언(法言)이 있다. 제발 우리 경찰관들이 해야할 일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